송수연 기자의 ‘히포구라테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의료는 ‘우수’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 세계 최고 병원에 많은 병원이 이름을 올린 나라 중 하나다. 내분비내과, 종양학, 비뇨의학, 소화기내과 등 임상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세계 TOP10 안에 드는 한국 병원들도 있다. 뉴스위크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4)’을 발표하면서 미국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대표 ‘스마트병원’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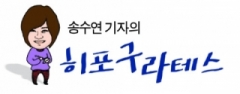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의료기술은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을 늘렸고 ‘회피가능사망률’은 줄였다(OECD Health Statistics 2023).
하지만 안에서 보는 한국 의료는 ‘불안’하기만 하다.
바이탈(vital)을 다루는 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넘어 아예 전문의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대학병원에 남아 전문의나 전임의(펠로우) 과정을 밟으려는 의사들이 줄면서 이른바 ‘기피과’뿐만 아니라 ‘인기과’도 후임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대학병원에 남기보다 개원을 택한다.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 환자들을 진료하는 대학병원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미래가 암담하다”고 한다.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제 내려오는 길만 남았다”고도 한다. 더 늦기 전에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는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 일반 국민도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 초점은 ‘숫자’에만 맞춰진 듯하다. 의사 ‘수’를 늘리고 지방 수련병원 배정 전공의 ‘수’를 늘리는 식이다. 위험부담은 크지만 보상이 적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사 수를 늘려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몸값 올리기’,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된다.
이대로 가면 ‘세계 최고 병원’ 명단에서 한국 병원을 찾기 힘들어 질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