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의 醫藥富業
며칠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미주 지역 한방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최종 보고서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 원문을 찾아봤다. 9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한의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증에 'MD(Doctor of Medicine)' 표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물론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개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개업을 하기 위한 각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국책 과제로 발주하는 진흥원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궁금해 졌다.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그 어떤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인터넷과 여러가지 보고서를 짜깁기 해서 만든, 수준 낮은 보고서였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본문 제일 첫 페이지에 오타가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 캡처한 노란색 부분에서 세계라고 써야 하는데 시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 명색이 보고서이고 돈을 받고 시행했다면 내용에 앞서 교정은 필수 인데 첫 페이지 오타는 참으로 성의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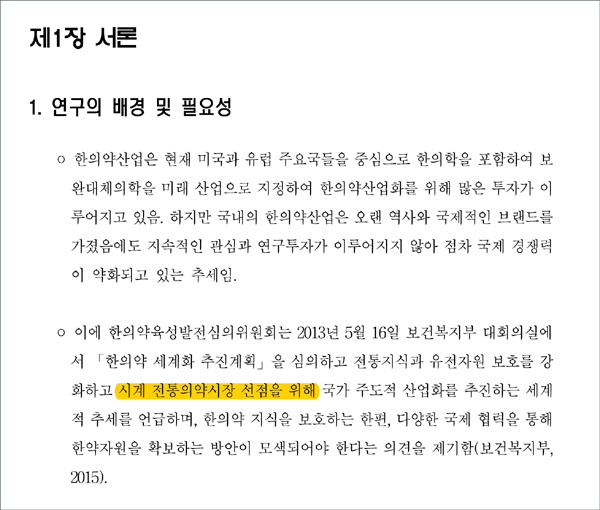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보니 한방에 대한 불합리성이 더욱 잘 보인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포 단계와 동물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는 전임상시험을 우선 거쳐야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치는데, 임상1상시험은 유효성보다는 무해성을 증명해야 한다. 임상 2상시험에서는 소규모 환자 집단에서 유효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두 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임상 3상시험은 대규모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그 약효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3~4번의 임상시험이 끝나 그 무해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의 시판을 허가한다. 그런데 약에 따라서는 4상, 즉 시판 후 임상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기도 한다. 각 단계별 임상시험은 모두 까다로운 식약처의 기준이 있고 이러한 약을 개발한 기업은 임상시험을 도와주는 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에 위탁해 실시한다. 이러한 신약 개발 단계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쓰여지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약은 어쩌면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건너뛰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약이다.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모든 검증과정이 생략된 채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 입장에서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다.
한방의 미국 진출을 논하기 전에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우리의 5천년 역사가 녹아있는 한방이라는 말만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하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MD를 붙여서 미국 가겠다고?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