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태희 전공의
"공대 출신 '정체성' 살려 영상의학 발전 보탬 되겠다"
다양한 배경 가진 '연구하는 의사' 키울 환경 갖춰야
갑진년 새해다. 새로운 출발선에 설 때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태희 전공의도 미국영상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편집위원(Assistant Editor)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 전공의는 공과대학 출신이다. 게임 개발자이기도 했다. 뇌 PET-CT 영상 보정 작업을 하면서 연구에 재미를 붙였다. 의대에 진학한 후로도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모델 연구에 전력하고 있다. AJR과 유럽영상의학회지(European Radiology) 심사위원(Reviewer)으로 관련 논문을 심사한 경력이 이번 편집위원직으로 이어졌다.
사실 수험생 때만 해도 의대 진학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공대에 입학했고 넷마블 자회사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했다. 유학도 준비했다. 그러다 생각했다. "'원 오브 뎀'(one of them)"은 되고 싶지 않다고.
서울의대에 편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지금 그는 '공대 출신 연구하는 의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 낮에 진료하고 밤에는 연구한다. 의료 AI 모델 개발을 다루며 "의료와 기술 분야의 시대적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병원에서 계속 연구하길 꿈꾸기에 "시대적 흐름과 반대"로 가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대 출신 의사도 연구하는 의사도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같은 시도가 계속 돼야 한다고 여긴다. 의대생이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가 나오고 동시에 더 많은 의사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길 바란다.
청년의사는 이 전공의를 만나 연구하는 의사로서 그 생각을 자세히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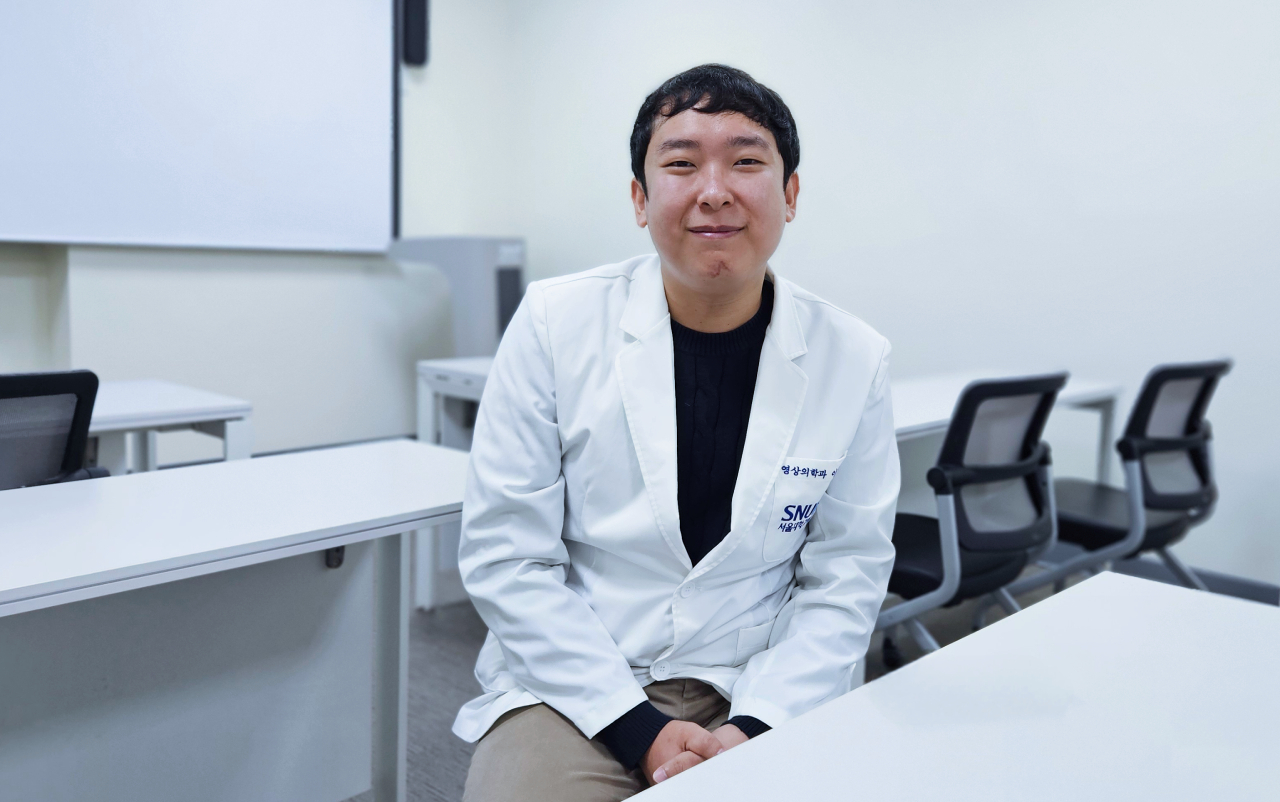
- AJR에게 편집위원직을 제안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메일을 잘못 보낸 줄 알았다. 아니면 스팸인가?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단 말이 더 맞겠다. 대체 내 무엇을 보고 제안했지? AJR 논문 심사도 4편밖에 안 해서 더 그랬다.
학과장인 구진모 교수님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 수락했다. 아직도 얼떨떨하다. 주위에서 기뻐하니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도 든다.
- AJR 편집위원으로서 새롭게 제시하고 싶은 편집 방향이 있다면.
영상의학자와 AI의 관계다. AI가 발전하면서 영상의학자 자리가 흔들릴 거란 우려가 크다. 나 역시 챗GPT가 등장한 뒤로 이러다 밥줄 끊기는 거 아닌가 할 때가 있다. 영상의학자 고유 역할을 지키면서 AI와 함께 일하는 방향을 찾고 싶다. 또 영상의학자와 AI가 만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다뤄보고자 한다.
- 공대 출신으로 의대에 왔다. 의전원 준비도 했는데 의전원 취지에 부합하는 인재이기도 하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전원 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의전원이나 비슷한 진학 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나 같은 사람이 의대에 올 수 있는 트랙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대 출신 의사'라는 내 정체성은 의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대학과 병원에서도 공학 분야 배경을 갖춘 사람을 찾는 분위기다. 어느 정도 진입로를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도 편입이나 의전원으로 의학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양한 길을 가고 있다. 내 동기만 해도 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의대에 들어와서 철학과 의학을 접목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다. 인류학과 공학을 병행하다 정신건강의학과로 온 친구도 있다. 전문의 수련을 마치면 로스쿨에 진학해서 장애 관련 법제도를 공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전원 같은 진학 트랙이 있으면 다양한 배경의 의사를 키우고 또 의사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밑거름이 될 거다.
- 공대 출신 의사면서 연구하는 의사를 지향한다. 트렌드를 따르지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역행하고도 있다. 영상의학과도 연구하는 사람이 귀해진 시대다.
맞다. 교직의 위상이 이전 같지는 않다. 영상의학은 대학병원 안팎의 업무량과 대우 차이가 커서 특히 더 그렇다. 이제는 대학병원 밖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사실이다.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과에서 고민이 많다. 이전에는 성적 중심으로 선발했다. 요즘은 그렇게만 해서는 연구 지망자 찾기가 쉽지 않다. 영상의학과는 공부하는 과라 더 그렇다. 과에서도 전공의들에게 연구에 관심 있는 후배는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느냐고 자주 질문한다. 솔직히 답이 없다. 지원서로 가려내기 어렵다. 면접을 봐도 연구에 대한 진솔함과 열정을 10분 만에 검증하긴 힘들다. 들어온 전공의에게 연구를 강요할 수도 없다.
- 정말 방법이 없을까.
아예 학부부터 연구에 대한 흥미를 북돋는 환경을 조성하면 어떨까. 의대 공부에 치여 연구는 내 일이 아니라고 아예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싶어도 시간 내기 어렵기도 하다. 이런 이들도 연구가 재미있는 일이고 내 일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고려해 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서울의대는 본과 4학년에게 연구를 비롯해 특정 주제로 개인 역량을 쌓을 시간을 부여한다. 나는 바이탈 사인으로 수술 중 저혈압 발생을 예측하는 모델을 연구했다. 논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본과 4년 중 가장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이 앞으로 의사가 연구를 하고 교직으로 나아가는 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실제로 학부 과정부터 자기 연구를 시작하고 논문으로 성과를 내는 학생도 늘고 있다. 연구나 교직에 관심을 둔 후배가 우리 과를 찾아주길 바란다.
- 연구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서울의대처럼 의사과학자 '맛보기' 과정을 마련한 의대가 많다. 적극적으로 나서보길 권한다. 일단 교수님들은 다 좋아한다(웃음). 의지가 있다면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다. 관심이 큰 만큼 거창한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비슷할 거다. 그래도 소규모 연구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다. 연구가 늘 성공할 수만은 없다. 실패하면 상처도 입는다. '이게 뭐라고' 싶기도 하다. 그러니 작은 단계부터 조금씩 키워나가길 권한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생기고 동기 유발도 된다. 나도 계속 연구해 나갈 힘을 여기에서 얻는다.
- 그럼 연구자로서 최종 목표는.
거창한 목표는 없다. 공대 출신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장하고자 한다. 비록 컴퓨터공학 최전선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과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내 강점이다. 공학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영상의학과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프로그램 개발은 워낙 변화가 급격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 못하겠다. 그래도 이 분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얼마나 발전할지 한 번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
- 어떤 의사가 되고자 하나.
무엇보다 첫 번째는 정확히 판독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다. 연구자로서 성취는 그다음이다. 어쨌건 나도 환자를 보는 의사인 거다. 영상의학과가 환자를 직접 대하는 시간이 적다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가 연구하는 의사다. 좋은 진료를 하려면 더 정확한 판독 기술이 필요하다. 판독이 적절한 진료로 이어지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 내 연구로 그 길을 다지고 싶다.
- 새해를 맞아 〈청년의사〉 애독자로서 한 마디.
제호처럼 우리 젊은 의사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 목소리를 내려 해도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언론이 젊은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서도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