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종충남대병원 이병국 신생아중환자실장
하루하루 고비였던 쌍둥이 치료…“수많은 의료진 덕분”
생명 살려도 적자인 ‘현실’…지역·필수 인센티브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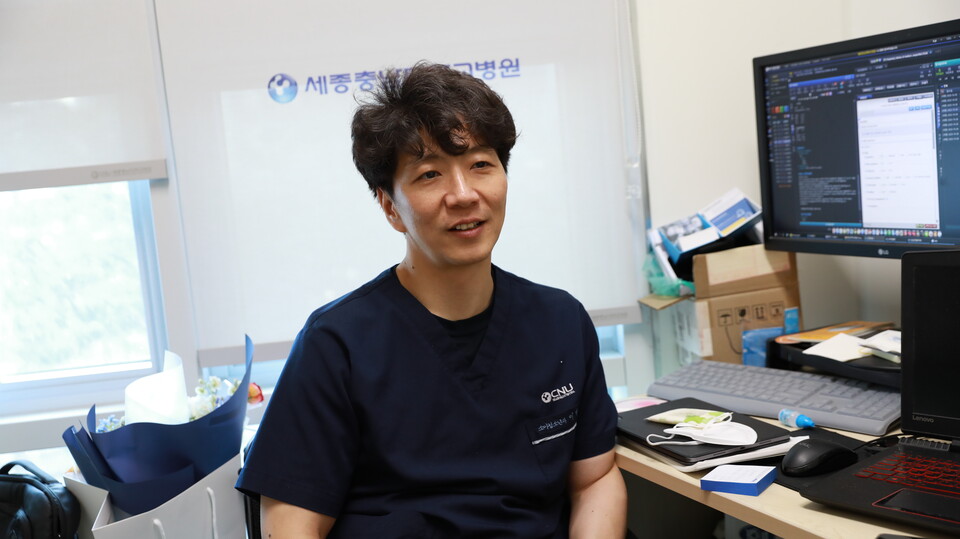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이르게, 또 가장 작게 태어난 이른둥이(쌍둥이) 형제가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갔다. 22주 3일 만에 고작 410g의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쌍둥이는 출생 당시보다 10배 넘는 4kg으로 병원 밖을 나설 수 있었다.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0%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종충남대병원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부모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 냈다.
국제 질병 분류상 생존 주산기(周産期)는 임신 22주부터로 정의되는데 실제 생존 가능성은 체중 500g 이상일 때부터 의미 있게 나타난다. 또 실제 생존 가능성은 임신 24주 미만의 미숙아가 20% 전후에 불과하고 쌍둥이의 생존 가능성은 그보다도 더 희박해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이 국내 초극소 저체중 쌍둥이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더욱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지역에서 임신 22주를 갓 넘은 산모를 받아 미숙아를 치료하겠다는 병원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 3월 4일 임신 5개월 차에 갑자기 양수가 터진 쌍둥이의 엄마도 거주하던 대전에서 세종으로 겨우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직후였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산모를 받은 곳이 바로 세종충남대병원이었다. 기적이 탄생했지만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쌍둥이 형제를 출생 직후부터 치료해 온 신생아중환자실장인 이병국 교수는 “하루하루가 고비였다”고 회상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는 쌍둥이 형제의 곁에는 의료진이 24시간 내내 상주했다. “아이들이 살 수 있을 때까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내의 특명도 쌍둥이 형제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 교수의 아내는 간호사다.
출생 직후 기관삽관 등의 소생술을 받았던 쌍둥이 형제는 생후 50일까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간신히 유지했다. 첫째는 출생 후 40일째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장천공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100일 직후에는 미숙아 망막증 치료를 위해 서울로 전원을 다녀오는 어려움도 견뎠다. 둘째도 생후 이틀 만에 기흉(氣胸)이 생겨 작은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합병증 없이 잘 살리자”는 게 목표였다.
“(쌍둥이처럼) 작은 아이들은 자리가 없어도 받자는 생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받았다기보다 그냥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어요. 결과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달리 없고요. 아이들이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도록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겸손하게 답했지만 이 교수는 국내에서 4번째로 작은 370g의 초극소 저체중아도 살려낸 실력 있는 의사다. 지난해에는 23주 이상으로 태어난 미숙아 생존율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기피 하는 신생아 중환자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을 넘어’ 수많은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첫째의 미숙아 망막증 수술은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가 맡았으며, 외과 수술은 충남대병원 소아외과 교수가 출장 수술을 해야 했다.
“신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겨 치료해야 하는 게 신생아 의료에요. 미숙아 망막증이 있어 치료해야 할 땐 안과에서 봐줬고, 외과 수술을 해야 할 땐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외과 교수가 출장을 와 수술해 줬습니다. 소아 피부 문제는 피부과에서 협진도 했어요.”
비단 의료진뿐만도 아니다. 이 교수는 며칠 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 담당자의 혼잣말을 듣고 감동했던 일화도 전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걸레질을 하면서 ‘내가 깨끗이 해야 아이들이 잘 살지’라고 혼잣말을 들으면서 병원 안의 수많은 이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구나 뭉클했다”고 전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을 찾은 아이들의 ‘안녕’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피, 땀, 눈물’을 쏟아내고 있구나 하고.
그러나 초극소 저체중아 치료 뒤 병원은 ‘적자’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의료진이 ‘피, 땀, 눈물’을 쏟아내 기꺼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나서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위 ‘인력을 갈아 넣어’ 완성한 결과물인 셈이다. 이 교수를 포함해 촉탁의 등 총 5명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지키고 있지만 이 교수는 여전히 주당 근무 시간 168시간 중 140시간을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볼 수밖에 없는 수가 구조 안에서는 신생아 중환자 의학 발전에 필요한 투자조차 어렵다. 지역 상황은 더하다.
“정부에서도 지역으로 의료진 유인을 위해 수가를 만들었지만 사실 의료진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지역에 남아 애써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회 제도 중 보건 제도는 지역 평등화가 큰 정책 기조인데 사실 반대로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어요. 의료진을 지역에 붙들기 위한 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살고 싶지만 그걸 희생하고 지역에 있으려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기사
- [신년특집]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소청과 의사
- 세종충남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개소 "전국 최고" 자신
- 끝없는 ‘의료대란’ 고위험 신생아 맡을 인력도 급감
- ‘분만 포기’하는 의료기관들…산부인과의원 10곳 중 9곳 “안 해요”
- "신생아‧소아 귀하다지만 말뿐"…미숙아 지원대책 '열악'
- 신생아 진료 의사의 한숨 "인력 부족,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 국내서 가장 작게 태어난 260g 아기…부모 품 안겨 퇴원
- 이주영 “1.5kg 미만 미숙아 극단적 예외…尹, 하나마나한 쇼”
-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진료 복구 시작…홀수일 야간 진료 재개
- 미숙아 출생부터 성장·치료까지…'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 미숙아·이상아 출산 비중↑…소청과 전문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