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김현정 센터장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품, 패션, 미디어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상한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서울의료원에 있다. 바로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김현정 센터장. 하물며 그의 본업은 디자이너도 아닌 피부과 전문의다. 지금도 그는 임상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서비스디자인을 시작하다
본인을 평범한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는 김 센터장, 어떻게 서비스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걸까. 그 시작은 2014년, 그가 싱가포르 내셔널스킨센터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였다. 김 센터장은 어느 날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서울시에서 공공의료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그 일을 맡아서 할 센터를 운영 해달라는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김 원장의 선택은 탁월했다. 하지만 서비스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피부과 전문의인 김 센터장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왜 나를 선택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웃음) 지난 2013년 워크숍에서 서울의료원의 브랜드네이밍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병원의 환경과 이미지를 개선하자', '크리스마스 때 산타 모자를 쓰고 진료하자'는 제안들을 했죠. 나중에 의료진에게 산타 모자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직후 싱가포르로 연수를 떠났고 1년 뒤 돌아오니까 원장님이 서비스디자인센터를 제안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발표를 계기로 내게 센터를 맡겨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디자인 경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했었다. 게다가 평소에도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서비스디자인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기엔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막막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한 일이 공부였다.
“조직을 만들어야하는데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온라인MBA를 시작했죠. 조직관리, 인사, 회계, 전략수립 이런 내용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어요. 그리고 경영, 서비스디자인 책들을 모두 찾아 읽고, 줄그어 가면서 외우고, 노트 만들고…. 정말 의대생처럼 공부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남편한테 도움도 여러 번 받았죠.”
답은 팀워크에 있다
김 센터장 혼자 시작한 센터지만 2015년 6월, 지금의 직원들을 만나 식구가 4명으로 늘었다. 서비스디자인 실무를 책임지는 팽한솔 팀장, 보건기획 담당 박성원 간호사, 그리고 교육기획 담당 구슬지 디자이너까지. 이들은 지금도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 조합을 ‘어벤저스’라고 표현한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들하고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침 서비스디자인으로 워낙 유명했던 팽 팀장이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섭외했죠. 그리고 간호사 선배에게 좋은 후배를 소개해 달라 부탁해서 박 간호사를 만나게 됐고요. 교육 스타트업에 몸담았던 구슬지 디자이너까지 합류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센터가 구성 됐죠. 다른 병원들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이런 조합의 팀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묻는데, 이건 우리 외에는 안 된다고 건방지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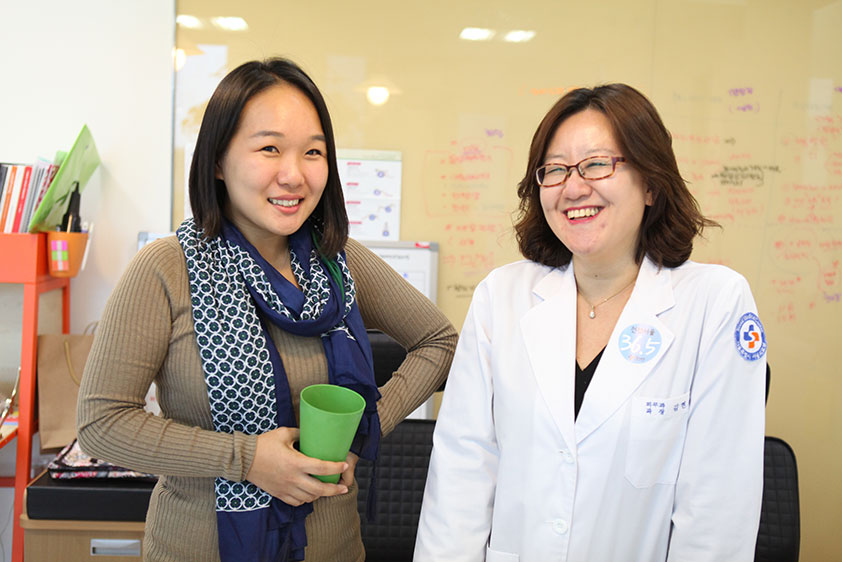
구성원들이 센터의 성과를 끌어올린 것은 각자 실력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김 센터장이 수평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도 주효했다. 업무량 분담도 공평하게 하고, 직위 상관없이 누구나 회의를 소집해 편안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센터장의 아이디어도 직원들이 반려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한 조직이었다.
“센터 만들 때 여러 경영학 교수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진료가 없는 날은 하루에 세 번씩 미팅을 했죠.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건 딱 하나, 수평적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수직적 구조인 조직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짐을 옮겨도 나눠서 옮기고, 아이디어를 내는 비중도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
그는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장이자 홍보팀장이며, 피부과 전문의로서 연구와 임상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만 해도 벅찰 일을 여러 개 하느라 힘들 법하지만 김 센터장은 오히려 그것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임상을 하면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내 커뮤니케이션도 편해져요. 병원은 다른 곳에 비해 개방적이지 않은 곳인데, 같은 병원 구성원이 부탁하면 직원들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병원에 섞여 들어가 서로 협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줍니다. 한번은 센터 행사 때문에 일요일에 병원 의료진을 불렀는데 다들 참석해줘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유쾌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센터장은 '행운'이나 '도움' 같은 단어들을 자주 썼다. 행운이 따라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센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대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다. 하지만 센터가 그동안 이룬 성과에는 그의 지분도 상당했다. 시민들을 위해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김 센터장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행운과 도움이 끊이지 않았으리라. 새해에도 의사로서, 그리고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의 리더로서 활약할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