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웨스턴대 슐릭의대 정신과 이재헌 교수
한국의사면허만으로 캐나다 의대 교수 임용된 최초 사례
정신과 초진 환자, 76분 이상 진료해야 수가 책정
“한국은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없는 구조”
‘3분 진료’로 표현되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자유로운 진료과는 없다. 정신건강의학과도 마찬가지다. 정신과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금쪽상담소의 오은영 박사’를 원하지만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캐나다 웨스턴대(Western University) 슐릭의과대학(Schulich School of Medicine & Dentistry) 정신과 이재헌 교수는 캐나다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국 의료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환자 중심도 아닐뿐더러 ‘배운 대로’ 진료할 수 없는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다.
이 교수는 별도 의사면허시험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없이 웨스턴대 정규 교수로 임용된 한국인 최초 의사다. 지난 1881년 개교한 슐릭의대는 캐나다 17개 의대 중 한 곳으로 온타리오주 런던시에 위치해 있다.
이 교수는 온타리오주 의사면허를 받고 지난 7월부터 웨스턴대 런던헬스사이언스센터(London Health Science Centre) 빅토리아병원(Victoria Hospital) 정신과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해 온 이 교수에게 캐나다 의료 현장은 새로웠다. 환자 1명당 진료시간이 짧아야 수익이 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 정신과는 최소 20분 이상 진료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 초진 환자는 최소 75분은 상담하고 진료해야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1명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가 10명을 넘지 않는 이유다. 한국 정신과의 경우 환자 1명당 진료 시간은 보통 10~15분이다.
진료기록 시스템도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진료기록은 의사 간 소통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약해서 담는다면 캐나다에서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다. 의사가 아닌 환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진료기록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의사가 구술로 진료 내용을 녹음해서 파일을 넘기면 글로 정리해주는 담당자가 있다.
이 교수는 “교과서에 ‘10분 진료’는 없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없는 구조다. 기본적인 토대가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다르다”며 “역설적으로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제도의 틀 안에서 한국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청년의사와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갖고 한국과 다른 캐나다 의료체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별도 면허시험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 교수로 채용된 ‘비법’도 공유했다. 이 교수는 한국 의사면허만으로도 캐나다에서 의사로 ‘고용’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교수는 캐나다에 관심이 있는 한국 동료 의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도 했다.

-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별도 의사면허시험을 보거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아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필수라고 여겼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캐나다 의대 교수로 임용됐는가.
캐나다는 주마다 의사면허제도가 조금씩 다르며 종류도 여러 가지다. 예를 들면 전공의나 펠로우(전임의)에게 주는 면허가 있고 외국 의사에게 주는 면허가 따로 있다. 물론 시험을 보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면 주는 의사면허도 있다. 나처럼 외국 의사가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되면 다소 제한적이지만 고용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 이 면허로 개원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부교수 이상 되면 일정 심사를 거쳐 (개원도 가능한) 독립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영연방 국가와 달리 한국 의사면허는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기에 온타리오주에서 한국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려면 시험을 보고 전공의 수련을 받거나 대학병원 교수로 임용되는 방법 밖에 없다.
- 시험을 보거나 전공의 수련을 밟지 않고도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취득했는가.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할 준비를 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다시 받으려고 했었다. 사실 정보가 별로 없었다. 의사면허시험을 다시 보고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만 알려졌다. 미국 의사면허시험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와 달리 캐나다 의사면허시험인 ‘MCCQE(Medical Council of Canada Qualifying Examination)’에 대해서는 정보도 별로 없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병원과 매칭할 때 해외 의대를 졸업한 ‘IMG(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를 뽑는 트랙도 따로 있다. 그런데 IMG 대부분이 해외 의대를 졸업한 캐나다인이어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데만 2년 정도 걸렸다. 캐나다의사협회나 온타리오주의사협회,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곳에 문의했다. 그 과정을 거쳐 대학병원 교수로 고용되면 별도 시험이나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정보 부재로 캐나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싶어 하는 한국 의사 대부분이 면허시험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 보통 대학병원 교수로 정식 채용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나도 캐나다에서 의대 교수로 근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기에 정신과 수련을 다시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지인이 한국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한 경력이 있으니 도전해보라고 권유하더라. 온타리오주에 있는 대학 몇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고 웨스턴대도 임용 공고가 나서 서류를 접수했다. Visiting Professorship으로 지원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토론토의대에서 있었는데 도움이 됐다.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캐나다 의료 시스템 경험 여부다.
- 온타리오주 외 다른 주에도 이같은 면허제도가 있는가.
온타리오주가 상대적으로 외국 의사가 진입하기 힘든 곳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따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은 병원에서 임시로 채용한 후 3개월간 근무한 결과를 토대로 제한적인 면허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지역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외지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도 거의 없어서 선호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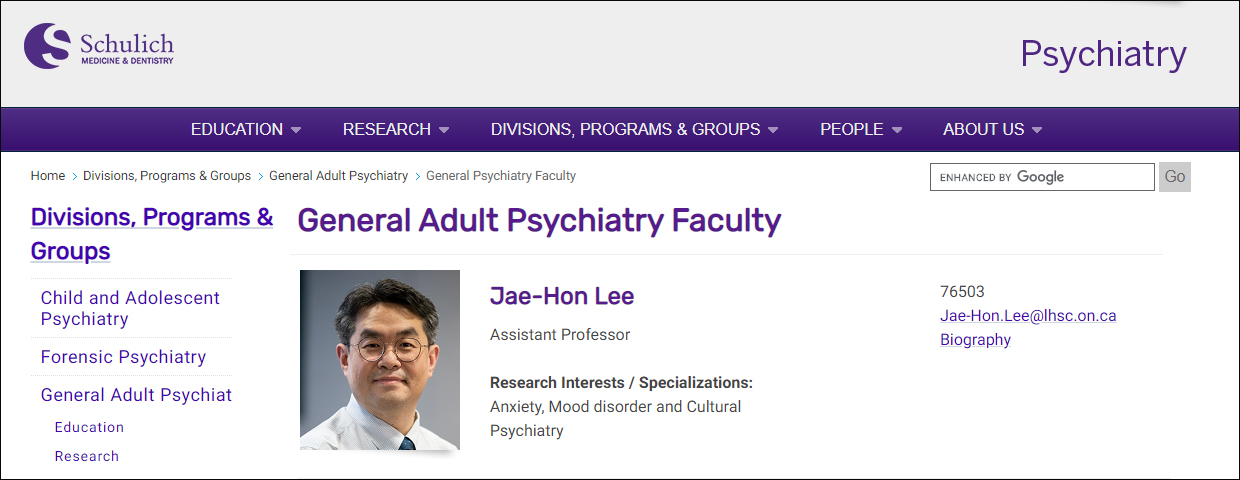
- 캐나다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
한국 대학병원 정신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보는 것인지 내과 환자를 보는 것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다. 캐나다는 느리긴 해도 환자 1명당 충분한 진료시간이 주어진다. 5분 진료는 아예 없다.
- 한국과 얼마나 다른가.
캐나다 정신과에서는 초진 환자인 경우는 75분을 넘겨야 의료보험 수가를 인정해준다. 진료시간 46분 이상, 20분 이상에 대한 수가도 있다. 90분 이상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도 있다. 20분 미만일 경우 수가가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다. 그래서 10분 진료할 바에야 20분 진료하는 게 수익 면에서는 낫다. 진료기록도 세세하게 남겨야 하기에 20분 미만으로 진료하면 오히려 손해다.
또 2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수가가 조금 더 높게 책정돼 있으며 소아청소년도 높다. 또 21세 미만 환자가 가족을 동반해서 진료를 받으면 ‘패밀리 수가’가 책정된다. 의사 간 컨설테이션(consultation)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 내에서도 온타리오주는 인구가 많아서 수가가 낮은 편에 속하고 다른 주는 더 높다.
- 한국과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더 비교될 것 같다.
한국 대학병원의 경우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려오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떨어져도 짧게 진료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 1명을 60분 동안 진료하면 바보 취급받을 수 있다. 그게 싫으면 개원해야 하는데 정신과의원이라고 해도 수가는 정해져 있기에 그에 맞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제도의 틀 안에서 한국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의사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 한국 의료체계에 더 익숙한 상태였을 텐데 캐나다에 와서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지는 않았나.
한국에 있을 때는 3시간에 30~40명씩 진료했다. 그래서 지금도 팔로 업(follow up) 환자는 빨리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하지만 초진 환자를 진료할 때 75분은 긴 시간이 아니다. 이슈가 많은 환자는 45분도 금방 지나간다. 한국에서는 진료 시간이 긴 정신과 치료는 정신분석만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싶어도 정신분석 치료가 아니면 힘들었다.
환자들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금쪽같은 내새끼’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처럼 충분히 상담받길 원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를 찾아가도 5분밖에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캐나다에 와서 동료 정신과 의사들에게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4~5명 정도라고 하더라. 환자가 많은 의사도 하루 6~7명을 진료한다. 아무리 많아도 10명을 넘지 않더라.
- 환자 진료기록을 자세하게 남겨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한국처럼 차트에 한두 줄 남기고 마는 게 없다. 20분을 진료해도 A4 반장을 써야 한다. 76분 진료하면 A4 3장 반 분량으로 정리한다. 진료기록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부담된다.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시간을 진료 시간에 포함해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도 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 작성을 도와주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의사가 진료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그 파일을 주면 그걸 듣고 텍스트로 옮겨 주는 직원이 있다. 온타리오주는 진료기록 작성 시간이 진료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캐나다 의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은 없는가.
캐나다는 환자들이 병원에 돈을 내지 않는 무상의료체계다. 그 대신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그 이상이다. 전문의한테 진료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도 한번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케어받는다.
-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환자 1명당 진료 시간이 길다보니 그만큼 다른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1차 의료가 활성화돼 있어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전원 의뢰 없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다. 이는 정신과도 마찬가지다.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으니 가정의학과 의사가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 인력은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민간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캐나다 내 분위기가 이에 부정적이다. 그렇다 보니 돈이 많은 환자는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 ‘3시간 대기, 3분 진료’로 표현되는 한국 의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한국 의료시스템보다는 북미 의료시스템이 조금 더 환자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 의사들이 남겨놓은 진료기록을 보면 정말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다. 환자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만 아는 용어나 약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기록한다. 환자 친화적인 시스템이다. 한국도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의료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환자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갔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 의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성실하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이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이어서 유창하지 않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언어에 대한 두려움은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다 이해해 준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여서 ‘우리 부모님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신다.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캐나다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라.

